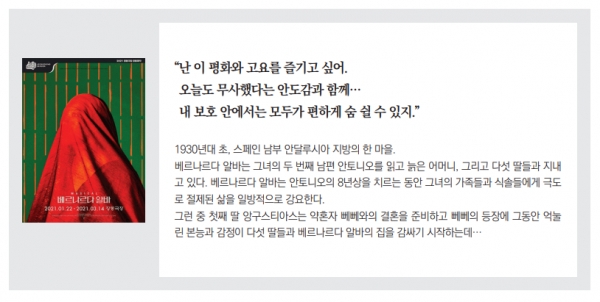뮤지컬 ‘베르나르다 알바’는 20세기 스페인을 대표하는 시인이자 극작가인 페데리코 가르시아 로르카(Federico García Lorca)의 ‘베르나르다 알바의 집’을 원작으로 마이클 존 라키우사(Michael John LaChiusa)가 대본·작사·음악을 맡아 재탄생시킨 작품이다. 제3회 한국뮤지컬 어워즈에서 ‘소극장 뮤지컬상’, ‘여우주연상(배우 정영주)’, ‘여자 신인상(배우 김환희)’, ‘음악상(음악감독 김성수)’ 등 4관왕을 차지하며 일찌감치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3년 만의 귀환에서는 베르나르다 알바로 출연하는 배우 정영주가 프로듀스까지 맡으며 기대를 한 몸에 받기도 했다.
스토리라인은 간단하다. 죽은 남편의 8년상을 치르며 가족들에게 절제된 삶을 강요하는 베르나르다 알바와 그녀의 억압 아래서 본능에 취해가는 다섯 딸,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켜보는 하녀들의 이야기다.
이 작품을 처음 접하는 순간 겪게 되는 감정은 ‘충격’ 그 자체다. 흔히 말하는 ‘뮤덕(뮤지컬 덕후)’들조차 ‘내가 뭘 보고 있는 거지?’라는 질문을 하게 만든다.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종류의 작품이기 때문이다. 우선 넘버(뮤지컬에서 사용되는 노래나 음악)가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리듬과 가사의 곡이 아니다. 작품을 선택할 때 기준으로 삼는 사람이 있을 만큼 넘버는 중요한 요소이다. 워낙 넘버가 이국적이다 보니 그 넘버에 맞춰 배우들이 자신의 몸을 악기처럼 두드리며 노래하는 모습도 어색하다.
좋고 나쁨의 문제는 아니다. ‘낯섦’의 영역일 뿐. 굳이 비유 하자면 평양냉면을 처음 먹었을 때는 별로라고 느꼈지만 자꾸만 생각이 났다는 사람들의 마음과 비슷하지 않을까. 아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평양냉면의 심심함보다는 마라와 고수의 자극적인 향에 가까우리라. 그만큼 이 작품은 이상하고 기괴해서 빠져들기가 여간 쉽지 않다.
그러나 낯선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이상하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이는 익숙해지기 전까지 잠깐 느끼는 감정에 불과하다. ‘베르나르다 알바’는 영리하게도 대사를 통해 재빠르게 관객 속으로 녹아든다. 그 안을 꽉 채우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익숙한 억압과 폭력들이기 때문이다. 1930년대 스페인을 살아가는 베르나르다 가족들이 겪는 일과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가 겪는 일이 그다지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을 깨닫는 순간, 관객은 주인공들과 순식간에 동화된다. 자신은 남편의 창녀였다고 말하는 베르나르다 알바, 못생겼다는 이유로 마을 남자들에게 핍박받아온 넷째 딸 마르띠리오, 마지막까지 처녀로 남아야 했던 막내 아델라까지. 인물들이 겪어온 삶만큼은 절대로 낯설 수가 없는 것이다.
연출 역시 기가 막히다. 텅 빈 하얀 무대 위에는 10개의 의자만 놓여있다. 텅 빈 무대 위에서 배우들은 대물림되는 억압과 그 안에서 뒤틀린 채 표출되는 욕망을 가감없이 표현 한다. 잘 쓰인 대본과 좋은 연출이 만난 덕분일까. 마지막 의자가 떨어지는 장면은 아델라가 등장하지 않았음에도 그 자체로 온몸에 소름이 끼치게 한다.
‘베르나르다 알바’는 쉽게 보기 힘든 여성 10인극이다. 정영주 배우는 인터뷰를 통해 “이 작품은 10명의 여자 배우들만 출연하는 공연으로 한국 뮤지컬 시장에서 흔치 않은 시도를 하고 있다. 10명의 여자 배우를 모으는 건 어렵지 않지만, 10명의 여자 배우만 나오는 공연을 올리기는 쉽지 않다. 의무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단언컨대 그토록 많은 관객이 ‘베르나르다 알바’에 열광하고 응원을 건넨 이유는 여성 10인극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욕망이 금기시되는 세계를 그리고 있는 ‘베르나르다 알바’는 얼핏 보면 고리타분한 옛일을 다룬 뮤지컬 같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얼마 전까지 우리의 삶도 이와 다르지 않았다. 누군가는 된장녀였고, 누군가는 김치녀였으며, 아직까지도 누군가는 여성을 공격할 수단으로 창녀라는 말을 사용한다. 무대와 관객 사이 90년의 간극은 사라지고 유대감만이 남게 되는 이유다. 그리고 관객은 깨닫는다. 이것은 베르나르다 알바 가문의 이야기가 아닌 기실 세상 모든 여성의 이야기라고.
가부장제를 유지하려는 사람이 베르나르다라는 점도 흥미롭다. 베르나르다는 그야말로 가부장제의 가장 큰 피해자가 아닌가. 그런 그녀가 남편이 죽은 뒤 앞장서 가족들을 억압한다는 점은 우리를 고민에 빠뜨리게 하는 지점이다. 피해자가 가해자로 전복되는 순간, 우리는 마냥 쉽게 그녀를 손가락질 할 수 있을 것인가. 죽어버린 딸의 시신을 보며 ‘예쁘게 치장해 처녀로 죽은 것처럼 만들라’는 모습은 섬뜩하기까지 하다. 그러나 익숙하다. 억지로 마른 몸을 만들고 피부 위에 겹겹이 색색의 화장을 한 채 높은 굽의 구두를 신고 걷던 누군가의 모습과 닮지 않았나? 과거 남성들이 만들어놓은 엄격한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 아등바등하던 또 다른 누군가가 떠오르지 않나? 그들 모두와 처녀성에 집착하는 베르나르다는 크게 다르지 않다. 어떤 여성이 보더라도 절절히 공감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이 작품이 가진 가장 큰 힘이다.
억압된 뜨거운 욕망들은 플라멩고를 통해 표출되고 담장 밖으로 넘어가지 않게 하려던 가문의 비밀은 누군가의 죽음을 통해 발가벗겨진다. 낯설고 기이하기만 했던 음악들은 들을수록 처절해 마치 누군가의 곡소리 같기도 하다. 그 어떤 수식어도 첫 관극의 충격을 표현할 수 없을 작품 ‘베르나르다 알바’는 오는 14일까지 정동극장에서 만나볼 수 있다.
이승희 기자 aga4458@kea.kr